| 광고 | |||
|
| |||
얼마전 상담을 요청한 한 가정은 외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보이던 단란한 가정이었다. 주부 H씨는 중형교회 여선교회에서 모범적으로 봉사하고 있던 40대 초반의 집사이다. 그녀의 남편 P씨는 대기업의 중견 간부이다. 그는 모태신앙을 자랑할 만큼 신앙에도 별 문제가 없는 듯했다. 고교에 다니는 아들 또한 신앙으로 잘 성장한 청소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남편 P씨는 퇴근시간이 오후 6시30분인데 오후 11시 전에 귀가한 적이 없다. 아내 또한 남편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쁨을 잊은지 오래다. 오히려 남편의 귀가시간이 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가족이 만나면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들을 미워하는 아버지는 사사건건 아들에게 잔소리를 시작한다. 심지어 아내가 아들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반찬을 몰래 버리기까지 한다. 어쩌다 사준 옷을 보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 주눅든 아들은 아버지만 보면 외면하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 아내 H씨는 중간에서 피가 마른다. 지옥이 따로 없다.
왜곡된 가정,역기능적인 가정이었다. 무엇이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내면에는 이성을 압도하고 판단을 왜곡시키는 깊은 상처가 자리잡고 있다. 내 뜻대로,내 생각대로 이끌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내가 나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정서적 고통이다.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큰 사건 즉,‘트라우마 현상’(외적 충격에 의한 장애)이라고 하는 상처는 치유 받기 전까지는 평생 나를 이끌어가며 괴롭힌다.
P씨는 어린 시절 의붓아버지에게 엄청한 폭언과 학대를 받고 자랐다. 지적을 당할때마다 벗어나려고 무척 애썼지만 아버지의 요구를 채울 수 없었다.그럴 때마다 못나고 부족한 자신 때문에 함께 야단 맞는 엄마의 모습이 더욱 그를 처참하게 만들었다. 성인이 된 후 잊은 줄 알았지만 왠지 모르게 아들의 못난 모습에 사사건건 분노가 치밀고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이 어린 시절의 자신을 투사하기 때문이란 것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됐다.
내면의 아픈 상처가 투사되는 외적 증상의 7가지가 있다. 첫째가 분노이다. 견딜 수 없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가족관계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린다. 통제가 안됨은 물론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감정의 홍수에 빠지게 만들어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질 못한다.
둘째,두려움으로 늘 노심초사하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벽에 걸린 시계가 떨어질까 두렵고 지나가던 다리가 무너질까 두렵다. 육교 밑을 지나기가 고통스러울 정도이다.
셋째,슬픔에 잠기어 특정한 일이 없음에도 늘 우울하다. 넷째,외로움이다. 가족이 있음에도 늘 내 마음은 혼자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 인생무상 또는 삶에 회의하고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으로 산다.
다섯째,수치심으로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다. 왠지 모르게 늘 부족한 것 같고 죄진 것을 남에게 들킬 것 같아 늘 부끄럽고 소심하다. 주위 사람이 못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아 고통스럽다. 여섯째,죄책감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증상을 회피해보려고 주위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게 된다. 별일 없을 때도 잘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며 늘 죄인처럼 남의 눈치를 보며 생활한다. 일곱번째,이러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으로 부자연스럽게 살다보니 삶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은 있으나 은혜가 없다. 가족이 있으나 행복하지 못하고 행하는 어떤 일에도 성취감이나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아픔의 상처가 삶을 지배하게 되면 ‘Don’t Talk’(말하지 마) ‘Don’t Trust’(믿지 마) ‘Don’t Feel’(느끼지도 마)의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며 가족관계 대인관계를 무너뜨리고 주위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며 생명력이 있는 감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늘 부정적인 생각 판단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며 살아가게 된다. 폴투루니에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은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사랑은 인간 행복의 뿌리이며 삶의 보람을 찾는 시작이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배워야 할 기술이라고 말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사랑하기 위하여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다. 또 사건을 은폐해 넘기려 하지 말고 시편 109편의 하나님께 향한 다윗의 고백처럼 토설해 마음속의 미움을 비워보자. 아울러 완전한 하나님께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나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마 16:19).
<최귀석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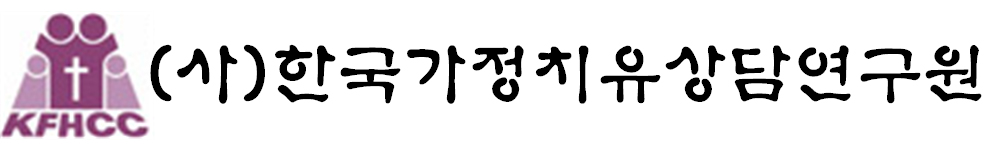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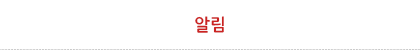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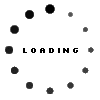
댓글0개